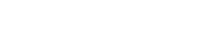사진작가 김영갑의 제주사랑
본문
-생을 던진 삶과 영혼이 기록-
김영갑의 사진도 작가가 자기의 생애를 오롯이 다 던져 찍은 삶과 영혼의 기록이다. 마라도의 바다 사진에도 그의 영혼이 출렁이고 있고, 노을 물든 하늘 사진에도 그의 생애가 붉게 녹아 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사진을 찍지 못해 불평하며 자리를 옮겨 다니는 사진가들을 보며 “접근 방식이 틀렸는데 장소를 옮겨간 들 찍을 것이 나타날 리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2~3일 기다리다가 원하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으면 자신은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투정을 부리거나 다른 사람의 행운을 부러워하는 사진가들과 그는 접근 방식 자체가 달랐다.
그는 필름에 담아야 할 풍경을 찾아 장소를 계속 옮겨 다니지 않았다. 그는 풍경 속으로 들어가고자 했다. 자기가 담아야 할 사진 속에 들어가 살면서 자신을 그 안에 녹여 냈다. 며칠이 아니라 몇 년 몇 달을 거기서 살았다. 먹을 것이 떨어지면 굶었고 어쩌다 돈이 생기면 필름을 먼저 사고 한두 시간 거리는 걸어 다녔다. 라면마저 여의치 않으면 냉수 한 사발로 끼니를 대신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가난과 외로움과 자신의 예술로부터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그런 태도를 중산간의 들판에게서 배웠다. 홍수와 가뭄과 태풍을 겪으면서 “끊임없는 비극과 고통 속에서도 비명 한번 내지르지 않고, 불평 한 번 없이, 절대로 도망치는 법도 없이 묵묵히 새 삶을 준비”하는 들판처럼 그는 살았다. 그는 찍어야 할 대상으로부터 인생의 자세와 예술 정신을 배우고자 했다.
“사람들은 노을 사진을 찍을 때 해가 수평선 너머로 잠기면 카메라를 챙겨 돌아온다. 그러나 15분쯤 후의 노을은 더욱 장관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른다. 그 황홀한 아름다움은 단 2~3분 안에 사라진다. 해가 솟기 20~30분 전의 청자빛 하늘은 한겨울이 으뜸”이라고 그는 말한다. 삽시간의 황홀을 놓치지 않고 그가 찍은 사진들은 그렇게 풍경을 오래 사랑하고 오래 기다릴 줄 안 결과였다.
그는 아름다움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지를 알았던 사람이다. 아름다움이 어떻게 예술이 되는지,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며 어떻게 영혼에 평화를 주는지를 알았던 사람이다. 그는 미학 이론을 말하지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술이 인간에게 주는 가장 값지고 가치 있는 것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사진을 통해 말하고 있다.
-돈·명예 아닌 ‘정신’을 남기다-
그러나 그 사진은 ‘가난한 사진작가의 길’ ‘고독한 인간의 길’ ‘자유로운 영혼의 길’에서 얻은 것들이다. 그는 제주로 내려가 오직 제주도 사진만을 찍었다. 긴장이 풀어진다 싶으면 전화도 없애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이고 철저히 외로워지며 작업에만 전념했고, 없는 돈을 모아 매년 전시회를 열었다. 그러면서 남들에게 인정받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려고 했다. 오직 자신의 예술만을 위해 의료보험증도 없이 신용카드 하나 없이 아내와 가족도 없이 철저하게 자기의 길을 갔다. 그러다가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으로 2년 전 세상을 떴다.
김영갑이야말로 ‘온몸으로 온몸을 평생 밀고 간’ 작가였다. 그는 돈으로 상을 사거나 이름을 구하지 않았다. 추천작가가 되려고 중앙을 기웃거리지 않았고, 대가의 그늘에 들기 위해 여기저기를 몰려다니지 않았다.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예술이 되는가를 몸으로 보여주고 갔다. 그의 짧은 생애는 외로웠지만 우리는 그를 통해 어떤 것이 진정한 예술인지, 작가정신이 무엇인지를 배운다.
〈도종환/ 시인〉
|
|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