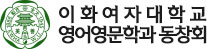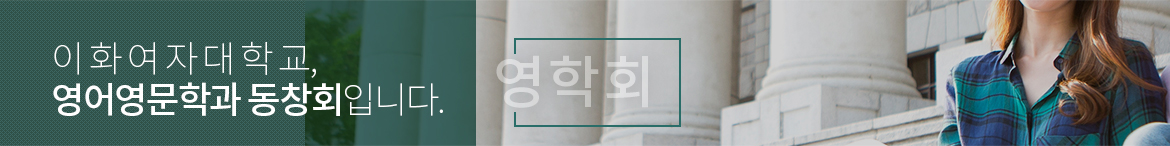제 1회 '이화사랑 글짓기대회' 총동창회장상 수상작
페이지 정보
영학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
) 본문
백복현(영문 82)
쑥개떡을 먹어본 지 꽤 오래 되었다. 봄 나물이 나올 무렵이면 어머니는 밥솥위에 얹어서 쪄낸 쑥개떡을 내 손에 쥐어주시곤 했다. 겨우내 읽은 낡은 잡지책을 옆에 놓고 어서 날이 풀려 고물장수 아저씨가 만화책을 싣고 동네에 나타나길 기다리던 봄은 내게 지루하기만 했다. 이를 눈치챈 어머니는 가끔 별식으로 내 지루한 봄날을 달래주셨던 것이다. 밥이 뜸드는 소리에 섞인 칼칼한 쑥내음의 김빠지는 소리와 함께 봄날은 하루하루 길어만 갔다.
봄도 벌써 지나 입동으로 접어들고 논두렁밭두렁에서 쑥을 캐던 처자들의 노랫소리도 아득하기만한 늦가을 어느날 L 선배님이 쑥개떡 만드는 법을 시연한다고 알리셨다.
어언 칠십 줄에 들어선 이화동창 L 선배님은 떡이라면 토론토에서, 아니 북미지역에서는 국보급에 해당하는 인간문화재다. 이 가을날 어디서 쑥을 뜯어다가 쑥개떡을 만들까, 초봄 들에서 난 쑥을 뜯어다가 쑥개떡을 만들까, 초봄 들에서 난 쑥을 혹시 냉동해서 재료로 쓰는 것은 아닐까 혼자 궁금했었다. 알고보니 L 선배님은 한국에 주문을 해서 쑥가루를 준비해오신 거였다. 부엌에 들어서니 가을 찬 바람을 녹여줄 따스한 김이 짐통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쑥개떡 시연을 위해 부엌을 오픈한 또 다른 이화선배는 찜통에 더운 물을 붓고는 한참 김을 올리고 있었다.
부엌에 토론토 이화 동창 여섯 여자들은 L선배님의 지시대로 곱게 빻은 쌀가루에 쑥가루를 섞기 시작한다. 예전엔 쌀이 귀해서 밀가루를 섞어 개떡을 만들었다고 한다. 오죽하면 이름이 개떡인가, 왠지 개 자가 들어가는 이름에선 천하고 상스런 느낌가지 받는다. 우리 동리에 아주 귀하게 태어난 아이가 있었는데 그아이의 이름이 개똥이였다. 천한 이름을 지어 주어야 잡신이 질투를 안한다고 해서 일부러 개똥이란 이름을 지어 불렀던 게다. 이름만 들어도 쑥개떡은 서민층에서 엉성하니 만들어 먹던 떡이란 생각이 든다. 격식을 따지지 않고 되는 대로 만들어 먹던 떡이기에 개떡이란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 제대로 된 재료에 정식으로 떡메로 치고 시루에 앉혀서 만든 찰떡과 차별화를 하여 그 격을 낮추어서 부른 서민의 떡이란 생각이 든다. 오죽하면 옛어른들은 '쑥떡같이 말해도 찰떡 같이 알아들으'란 말을 다 하셨을까... ...
그래도 나는 제삿상이나 명절 상에나 오르던 찰떡인 인절미나 절편보다는 봄 한철 먹어보는 어머니의 쑥개떡을 좋아했다. 쑥개떡을 한 손에 들고는 한없이 행복하기만 했던 어린 날에 대한 향수가 어쩌면 가을 찬바람에도 불구하고 내 발걸음을 서둘러 선배의 부엌으로 돌리게 했는지 모른다.
저녁밥을 앉히신 후에 어머니는 내게 특별식을 만들어주려고 남겨둔 불린 쌀 한 줌에, 들에서 캐온 쑥을 절구에 넣고는 콩콩 절구질을 하셨다. 적당히 빻아서 아직 덩어리가 만져지는 쌀과 쑥으로 얼기설기 반죽을 하셨고, 손바닥만한 개떡이 빚어질 즈음이면 밥솥에선 밥물이 끓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이때 솥단지를 열고는 김이 막 오르기 시작한 밥 위에다 떡반죽을 하나, 둘 들이미시는 거였다. 쑥개떡이 제대로 익어 그 쫄깃쫄깃한 맛을 내려면 밥물이 한소금 더 끓어 올라야 했다.
이제 우리는 옅은 쑥색이 나는 쌀반죽을 밀어 개떡을 빚기 시작한다. 어머님의 투박하고 거칠은 개떡이 아니라 앙증맞기까지 한 작은 개떡을 빚는다. 만들어놓고 보니 호박씨, 포도씨로 장식까지 마친 떡은 개떡이라기 보단 화전에 가깝다. 이토록 쑥떡이 호사를 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이 떡은 쑥개떡이 아니라, 그저 쑥떡이라고 개명을 해야하는 지 모르겠다. 포크를 꾹꾹 눌러 빗살 무늬까지 새기니 쑥개떡은 이제 영락없는 절편의 모습이다. 눈과 코를 호박씨로 삼고 물끄러미 내려다본 쑥떡의 모습은 어릴 적 어머니의 솥단지에서 쪄낸 쑥개떡을 한 쪽 받아쥐고 행복했던 내 얼굴같기도 하다.
어머니는 나를 한사코 자신의 부엌에서 밀어내셨다. 매캐한 연기 반, 그을음 반으로 빼곡한 부엌에서 간혹 행주치마에 눈물을 닦아내실 적마다, 아마도 어머니는 고명딸을 검불 섞인 밥 짓는 시골로는 시집을 보내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셨던가 보다. 한사코 나를 아궁이에서 밀어내시며 그저 '너 좋아하는 책 보고 있거라. 얼른 개떡 쪄주마' 하시는 거였다. 그래도 나는 어머니의 부엌 아궁이 앞에 있는 걸 좋아하였다. 아직 다 타지 않은 잔불을 부지깽이로 내리칠 때마다 그을음과 함께 타다닥 불곷이 타올랐다. 마른 잔솔가지를 골라 아궁이에 집어넣고는 불꽃이 재로 타오르는 동안, 그 소멸의 시간을 지켜보는 일을 사랑하였다. 무릇 생명 있는 것들에 대한 따스한 온기와 종국에는 재로 화하고 말 허망함이 어린 내 가슴에 자리하고 있었던 걸까, 검불이 타는 연기와 열기로 어머니의 부엌은 늘 흐려 있었지만, 어머니의 마음처럼 그 부엌은 언제나 따스했다.
저녁 밥과 쑥개떡이 뜸 드는 봄날, 부엌 툇마루에 앉아 저녁 어둠이 내리는 마당을 바라보면 내 마음도 고요히 가라앉곤 했다. 어머니의 부엌에서 쑥떡이 쪄지는 소릴 들으며 앞마당 우물가에 심어진 수국이나 철쭉 같은 봄꽃들이 봉오리 맺는 소릴 듣고 있노라면 평온한 저녁으로 나의 바쁜 마음도 저물어 갈 수 있었다. 돌아보면 부엌 톳마루에 앉아 쑥개떡이 익기를 기다리던 그 시절은 내 생애 가장 평안하고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찜통에선 김이 오르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드디어 우리는 쑥개떡의 탄생을 맞게 되었다. 반죽으로 빚었을 때보다 더 진하고 선명한 개떡 속에 호박씨가 몇개 박혀있다. 살짝 위로 치켜든 호박씨 눈이며 건포도로 빚은 코는 저절로 웃음이 나게 하는 개떡의 모습이다. 그 개떡에다가 참기름까지 발라 담아 놓으니 이건 쑥개떡이 아니라, 어느 양반집 제삿상에 오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다소곳하고 얌전한 모습의 쑥떡이 되었다.
쑥개떡 아닌 쑥떡을 하나 받아쥐고 나는 물끄러미 선배의 부엌에 서서 잎 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부엌 창문으로 삐져나온 뿌연 연기가 한 줄기 어둠으로 흘러가는 세월 저편 뜨락에 쑥개떡을 쥔 열 살 계집애가 말없이 서 있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