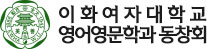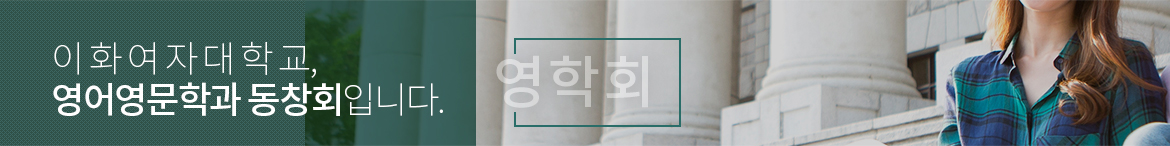이 태준 古宅에서 송두율씨를 생각하다
페이지 정보
오 부근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2003-11-08 00:39 조회1,289회 댓글231건본문
나는 봄, 가을로 있는 <간송미술관>의 전시회에는 될 수 있으면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 가려고 한다.
내가 무슨 대단한 문화인이서가 아니라 강남에서 느낄 수 없는 다른 향기,
소박하나 격있는 그 동네 분위기가 그리워 전시회를 핑계로 그곳에 들른다.
지난 주에도 친구들과 강북의 단풍도 보고, 전시회도 볼 겸 성북동 나들이를 하였다.
근처에서 점심을 간단히 해결하고, 간송미술관에 들러 조선중기회화전을 보고
미술관 앞 채마밭에 내려와 싱싱하게 자란 무우, 배추에 찬사를 뜸뿍,
옛시절의 향수를 실컨 되새김질 하고
문간에 늘어선 노오랗게 익은 조와 수수에게도 지나치지 않고 눈길과 입질을 하고
모퉁이 돌아 이웃한 <이 태준 고택>에 들렀다.
지금은 壽硯(수연)산방이란 이름의 고유차 찻집으로 바뀌었지만
단아한 조선 한옥의 모습은 낮은 울타리에 둘러싸여
얌전한 자태로 석양을 받으며 고즈넉히 앉아 있었다.
작은 대청마루 벽에 걸린 흑백 가족 사진속의 작가는
훤칠한 키에 반듯한 외모에서 은연중 지식인의 풍모가 느껴진다.
詩의 정 지용, 소설의 이 태준이라 불리어 질 정도로 삼,사십년대
한국문학의 걸출한 작가로 인정받았던 尙虛(상허) 李 泰俊.
그러나 그는 1946년 큰누이의 딸에게 성북동 이 집을 맡기고
가족을 데리고 홀연히 월북했다.
그 후 간간히 들려오는 풍문은 그가 동경했던 북의 공산사회에서
갖은 고통과 핍박을 받는등, 모두 가슴 아픈 것들 뿐이었다.
1969년경 원산부근 탄광촌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을
누군가 보았다는 것이 그의 마지막 소식이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따라서 남쪽에서는 당연히 '월북'작가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그의 책들은 한동안 금서로 분류 되었었다.
하지만 그의 작품들, <달밤><돌다리><누이>에서 만나는 글 속엔
이념의 색채보다는 서정성 깊은 그의 감성에 진한 감동을 받는다.
그의 수필집 <무서록>에서는 소박하고 자연스런 일상의 일들,
자연에 대한 깊은 애정과 예찬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그의 현실과 동떨어진 순수한 관념이 50년대 사상 열풍의 회오리속에서
北을 선택하게 하였는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움이 든다.
누구나 환경과 조건, 능력에 상관없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어 산다는
理想에서나 가능한, 어처구니 없는 그러나 그럴듯한 사상과 이념은
구 소련 체제의 무너짐과 동시에 폐기처분된 체제이자 이념 아닌가?
50년이 지난 지금도 이념과 사상이란 낡은 동아줄을 끈질기게 붙들고
아직도 이 사회에 이념의 분쟁을 일으키는 재독 철학자 송 두율씨를 보며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깨닫지 못하고 사상과 관념에 희생된
앞선 시대의 선배들의 말로를 반추하지 못하는 그가 안타까울 뿐이다.
더우기 송 두율씨의 내재적 접근이란 괴상한 논리는
절대빈곤과 인권사각지대에 방치된 북의 "인민"들의 처지를 생각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시대의 선배들과 달리 사상에서도 그는 순수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김 일성, 김 정일이란 공산독재권력자, 세습 권력자의 곁에서
곡학아세의 아부자로 노동신문의 일면에 화려하게, 당당하게
등장하는 그를 누가 양심있는 지식인이라 하겠는가?
'경계인'이란 현란한 수사로 자신을 포장하면서까지
이쪽 저쪽 권력의 언저리에 맴도는 약삭빠른 기회주의자로
보인다고 하면 지나친 폄하인가?
南의 유신독재, 군부독재에 항거한 양심이
北의 공산독재, 세습독재엔 '내재적 접근'이란
이상한 엿장수 가위로 넉넉히 봐 주는 것은 왜 일까?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든 제도에 완벽, 완전이란 없다고 하지 않던가.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도 적쟎은 모순이
상존한다는 것을 누가 부인하겠는가?
그러기에 갈등하는 것이 인간이고, 고뇌하는 것이 지식인이라 하지 않던가.
"내재적 접근"이니 "경계인"이니 현란한 수사나 모호한 언어 대신
올 곧은 생각과 맑은 양심으로 투명한 처세를 함으로써,
사상과 이념에 희생되어 비참한 삶을 살다간
월북 지식인들이 빠졌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 가려고 한다.
내가 무슨 대단한 문화인이서가 아니라 강남에서 느낄 수 없는 다른 향기,
소박하나 격있는 그 동네 분위기가 그리워 전시회를 핑계로 그곳에 들른다.
지난 주에도 친구들과 강북의 단풍도 보고, 전시회도 볼 겸 성북동 나들이를 하였다.
근처에서 점심을 간단히 해결하고, 간송미술관에 들러 조선중기회화전을 보고
미술관 앞 채마밭에 내려와 싱싱하게 자란 무우, 배추에 찬사를 뜸뿍,
옛시절의 향수를 실컨 되새김질 하고
문간에 늘어선 노오랗게 익은 조와 수수에게도 지나치지 않고 눈길과 입질을 하고
모퉁이 돌아 이웃한 <이 태준 고택>에 들렀다.
지금은 壽硯(수연)산방이란 이름의 고유차 찻집으로 바뀌었지만
단아한 조선 한옥의 모습은 낮은 울타리에 둘러싸여
얌전한 자태로 석양을 받으며 고즈넉히 앉아 있었다.
작은 대청마루 벽에 걸린 흑백 가족 사진속의 작가는
훤칠한 키에 반듯한 외모에서 은연중 지식인의 풍모가 느껴진다.
詩의 정 지용, 소설의 이 태준이라 불리어 질 정도로 삼,사십년대
한국문학의 걸출한 작가로 인정받았던 尙虛(상허) 李 泰俊.
그러나 그는 1946년 큰누이의 딸에게 성북동 이 집을 맡기고
가족을 데리고 홀연히 월북했다.
그 후 간간히 들려오는 풍문은 그가 동경했던 북의 공산사회에서
갖은 고통과 핍박을 받는등, 모두 가슴 아픈 것들 뿐이었다.
1969년경 원산부근 탄광촌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을
누군가 보았다는 것이 그의 마지막 소식이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따라서 남쪽에서는 당연히 '월북'작가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그의 책들은 한동안 금서로 분류 되었었다.
하지만 그의 작품들, <달밤><돌다리><누이>에서 만나는 글 속엔
이념의 색채보다는 서정성 깊은 그의 감성에 진한 감동을 받는다.
그의 수필집 <무서록>에서는 소박하고 자연스런 일상의 일들,
자연에 대한 깊은 애정과 예찬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그의 현실과 동떨어진 순수한 관념이 50년대 사상 열풍의 회오리속에서
北을 선택하게 하였는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움이 든다.
누구나 환경과 조건, 능력에 상관없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어 산다는
理想에서나 가능한, 어처구니 없는 그러나 그럴듯한 사상과 이념은
구 소련 체제의 무너짐과 동시에 폐기처분된 체제이자 이념 아닌가?
50년이 지난 지금도 이념과 사상이란 낡은 동아줄을 끈질기게 붙들고
아직도 이 사회에 이념의 분쟁을 일으키는 재독 철학자 송 두율씨를 보며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깨닫지 못하고 사상과 관념에 희생된
앞선 시대의 선배들의 말로를 반추하지 못하는 그가 안타까울 뿐이다.
더우기 송 두율씨의 내재적 접근이란 괴상한 논리는
절대빈곤과 인권사각지대에 방치된 북의 "인민"들의 처지를 생각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시대의 선배들과 달리 사상에서도 그는 순수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김 일성, 김 정일이란 공산독재권력자, 세습 권력자의 곁에서
곡학아세의 아부자로 노동신문의 일면에 화려하게, 당당하게
등장하는 그를 누가 양심있는 지식인이라 하겠는가?
'경계인'이란 현란한 수사로 자신을 포장하면서까지
이쪽 저쪽 권력의 언저리에 맴도는 약삭빠른 기회주의자로
보인다고 하면 지나친 폄하인가?
南의 유신독재, 군부독재에 항거한 양심이
北의 공산독재, 세습독재엔 '내재적 접근'이란
이상한 엿장수 가위로 넉넉히 봐 주는 것은 왜 일까?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든 제도에 완벽, 완전이란 없다고 하지 않던가.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도 적쟎은 모순이
상존한다는 것을 누가 부인하겠는가?
그러기에 갈등하는 것이 인간이고, 고뇌하는 것이 지식인이라 하지 않던가.
"내재적 접근"이니 "경계인"이니 현란한 수사나 모호한 언어 대신
올 곧은 생각과 맑은 양심으로 투명한 처세를 함으로써,
사상과 이념에 희생되어 비참한 삶을 살다간
월북 지식인들이 빠졌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댓글목록
송봉자님의 댓글
송봉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그 "경계인"은 우리가 경계해야될 인간이다